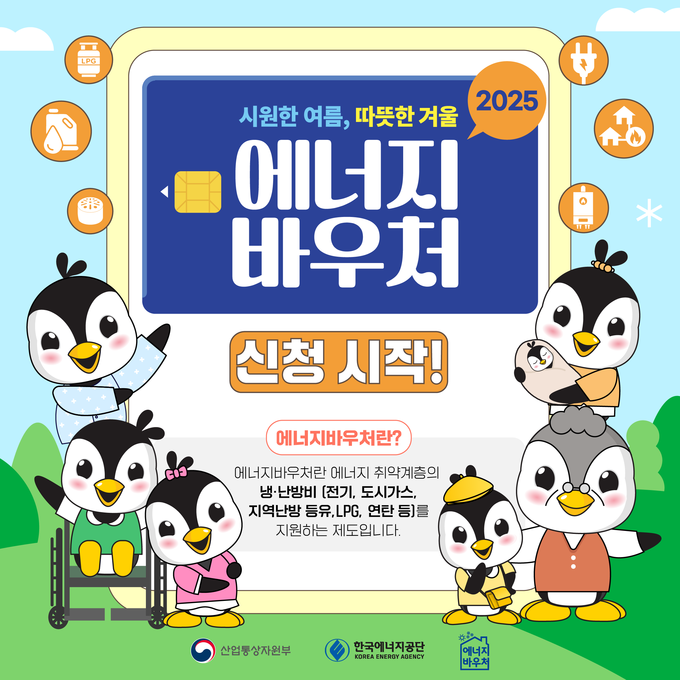오랜만에 들른 서울역은 언제나 그렇듯 떠나는 이들의 설렘으로 가득했지만 그런 감상을 깨뜨리는 불청객 같은 광경들이 펼쳐지고 있었다.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기차 탑승 시간까지 대기해야 하는 대합실 의자 여기저기에 앉아 있는 노숙인들의 모습이 그것이었다.
굳이 옆에 앉아 냄새를 확인하지 않아도 모양새만으로도 알 수 있는 노숙인들 주변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와중에도 빈 자리로 남아있었다. 딱히 그 사람들이 폐를 끼치거나 시비를 걸어서가 아니었다.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기색, 거기에다 수시로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한겨울 추위를 피하기 위해 어디서 구했는지도 모를 낡고 헤진 옷들을 덕지덕지 껴입고 있는 포스에 눌려 감히 그 옆으로 자리할 엄두가 안 났다는 게 진짜 이유였을 것이다.
누군가는 그런 노숙인들을 손가락질하고 대놓고 비아냥거리기도 하지만 단지 노숙인이라는 이유로 그런 대접을 받을 까닭은 없다. 그들도 언젠가는 이 사회의 대접받는 구성원이었을 테니 말이다.
노숙인이라고 눈치가 없을까. 그들도 안다. 아니 누구보다 잘 안다. 이 사회가 얼마나 자신들을 하찮게 대하는지를. 그래서 대부분의 노숙인들은 가급적 일반인(?)들과의 접촉을 피하고자 애쓴다. 그런 그들이 온갖 눈총과 멸시를 감내하고서라도 대합실 한가운데 머무는 이유는 하나다. 추워서다.
봄이거나 여름이거나 가을이었다면 굳이 그런 멸시를 감내하고서라도 이 공간에 머물지 않는다. 수시로 본가를 오가던 시절에 누구보다 자주 찾았던 서울역이니 그걸 모를 리가 없다.
그런 거였다. 다섯겹, 여섯겹을 껴입어도 참아낼 수 없는 추위가 그들을 이 공간으로 등 떠밀었다는 것. 그만큼 이 겨울의 추위는 끔찍하고 참혹했다.
평균적인 사람이었다면 그 추위를 피하고자 자신의 보금자리 어딘가에 놓인 보일러 온도를 올리고 살겠지만 그들에겐 그럴 집도, 보일러도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물론 집이 있다고 이 겨울의 추위를 오롯이 회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이들이 바로 쪽방촌 거주자들이다. 노동력도 변변찮고 가진 것도 없어 기초생활수급자이기 십상인 이들의 겨울은 사실 따지고 보면 서울역 노숙자들 못지않게 참혹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이 즈음이면 각종 언론매체에 그들의 삶을 애달파 하는 기사들이 꼬리를 잇곤 한다. 어느 날은 국회의원이, 또 어느 날은 서울시장이거나 기업체 대표인 사람들이 그들의 공간을 찾아 추위에 몸서리치는 이들에게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추위를 물리쳐주겠다는 말을 남기는 것일 터다.
다들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추위를 떨치지는 못한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하듯, 이 추위 역시 매한가지기 때문이다. 물론 어느 정도의 대안이 제시되기는 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에너지 바우처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비용을 돕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어느 정도 추위는 잡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그게 쉽지 않다. 이 자리에서 에너지 바우처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을 일일이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다. 꽤 길고 복잡한 일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그걸 받기 위해 해야할 일이 까다롭고 무엇보다 그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점이다.
정보에 어두운 사람들, 대표적으로 쪽방촌 거주자들처럼 늙고 세류에 어두운 이들이라면 더더욱 그럴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들이 이 엄동설한을 담요 하나로 버티는 것일 테고. 그래서 더 안타깝다.
2024년 기준 동절기 바우처는 가구당 약 30만 원 안팎에 달한다. 그 정도라면 자신들의 한 몸 데우기에는 충분한 금액일 테지만 대부분의 쪽방촌 거주자들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 그래서 더 안타깝다. 몰라서 못 하는 그 현실이.
많은 복지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형식보다 실질을, 대상보다 접근성을 우선해 재설계돼야 한다고 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해선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바우처가 연계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거다. 지금처럼 본인이 먼저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는 정보에 취약한 이들에게 사실상 ‘닫힌 복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절차도 좋고 정확한 대상을 선별하는 것도 좋다. 피같은 국민의 세금이 누수되지 않으려는 의도인 걸 모르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주절주절하는 건 지금처럼 에너지 바우처가 전설 속에서나 등장하는 유니콘처럼 좀처럼 현실에서 만나기 어려운 존재로 머무는 것이 안타까워서다.
쪽방촌은 말 그대로 ‘복지의 마지막 경계선’이다. 지원의 손이 닿을 듯 말 듯 끊기는 그 지점. 에너지 바우처는 존재하지만, 정보가 닿지 않고, 절차가 가로막으며, 때문에 체감이 닿지 않는다. 결국 남는 건 한겨울 벽 하나 너머의 추위뿐이다.
아직 겨울은 우리 곁에 있다. 언젠가 봄이 올 테지만 지금은 여전히 겨울이다. 사람의 온기가 이 겨울바람에 식어가지 않았으면 한다.